김동석 원장님의 글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이번 주제는 ‘관계를 경영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고객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트별로 각각 5회씩 총 10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치과 경영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박한 지식과 함께, 진솔하게 써 내려간 김동석 원장님의 새로운 연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글 | 김동석 원장(춘천 예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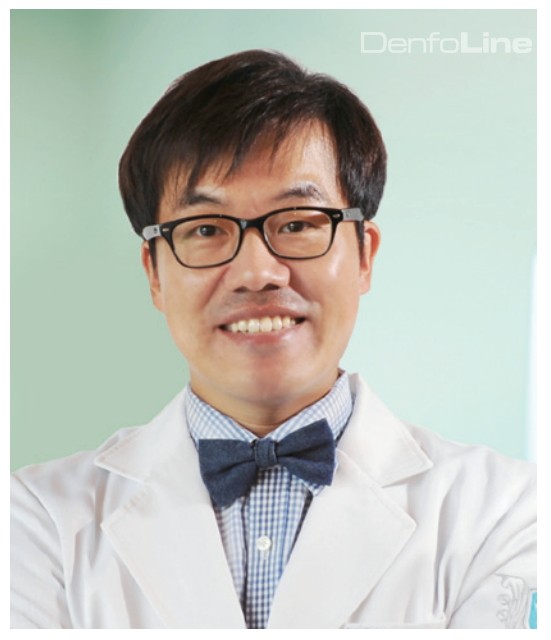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말이 조금은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모른다. 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인사를 한다. 인사를 받으면 거의 모두가 인사를 건네 온다. 하지만 그 중 몇 명은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받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음에 봐도 왠지 인사를 하기 싫어진다. 사람과의 관계는 뭔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인사도 안받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인사를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라는 곳이 늘 그렇다. 객관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늘 주관적인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 “같은 월급을 받는데 내가 더 일을 많이 한다”,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상사에게 잘 보이는 저 직원이 더 예쁨을 받는다”.
습관적인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이다. 월급이 적어도 배우는 게 많으니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적은 월급과 복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좋다는, 흔히 이야기하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경영자의 입장에서의 말이다. 직원의 입장은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 급여이든, 복지든, 스펙을 쌓는 것이든 여하튼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받는 것이 타당해야 움직인다. 이런 말을 충성직원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딱히 부정하기도 힘들 것이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지 말라
가끔 원장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있다. “내가 그 직원을 얼마나 가족처럼 대했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떠날 수 있냐”고. 그러면 나는 말한다. “가족이 아닌 직원을 왜 가족같이 대하셨어요? 그래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라고.
사실 가족같이 대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이해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경영자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말은 상당 부분 가부장적인 의미가 많다. 실제 가족이라면 어떤가 생각해보자. 가장의 입장에서 가족은 자신이 컨트롤해야 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압적인 면이 강하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무섭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 행복한 웃음도 끊이질 않는다. 그렇지만 심각한 잘못을 누가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주고 그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의 가정의 모습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어서 그런 의미의 가족이 직장의 개인주의로 옮아왔다고 보면 직장에서의 가족이라는 의미도 사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가족은 사랑과 용서로 뭉쳐있다.
가끔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병원경영자는 병원을 우선시하지만 직원은 철저하게 개인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병원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개인의 앞날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다. 스스로에 대한 노력과 투자도 병원과는 크게 상관없는 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지는 헌신적인 사랑과 용서라는 개념은 일하는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있으면 어색하다. 경영자와 직원은 경제적인 논리, 즉 월급이라는 틀에 의해 계약된 전략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자는 철학자 존 미첼 메이슨(John Mitchell Mason)의 말을 늘 기억해야 정신 건강에 좋다. “성실함의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라. 그리고 관대함의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라”
파트너는 가족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파트너 등록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소위 ‘가족’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항상 결혼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삶의 동반자로 등록하자는 법안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하우스 메이트’라는 이름으로 한 집안에 여럿이 가족처럼 살고 있거나, 동거나 연애를 오래했지만 사실혼이 아니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동성커플까지 흔히 ‘법외가족’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덴마크의 경우 이미 1989년 관련 법안을 발표하였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민결합이라고 불리는 이런 현상을 인정, 혹은 일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개념이 강한 나라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는 당분간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곳에 이런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어떨까?
과하지 않은 구속력 아래에서 허용된 자율과 개인주의, 필요함과 사랑이 섞여있고, 함께 뭔가를 이루고,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조직. 난 이상적인 병원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의 병원이 이런 파트너들의 모임이길 원한다. 법적으로 구속된 의무감이 아닌 개인주의적이면서 그 조직을 한없이 사랑하는 뭐 그런 모습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난 나와 일하는 모든 직원을 파트너라 부르고 싶다. 낯간지러운 가족이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듣기도 좋은 말 아닌가?


